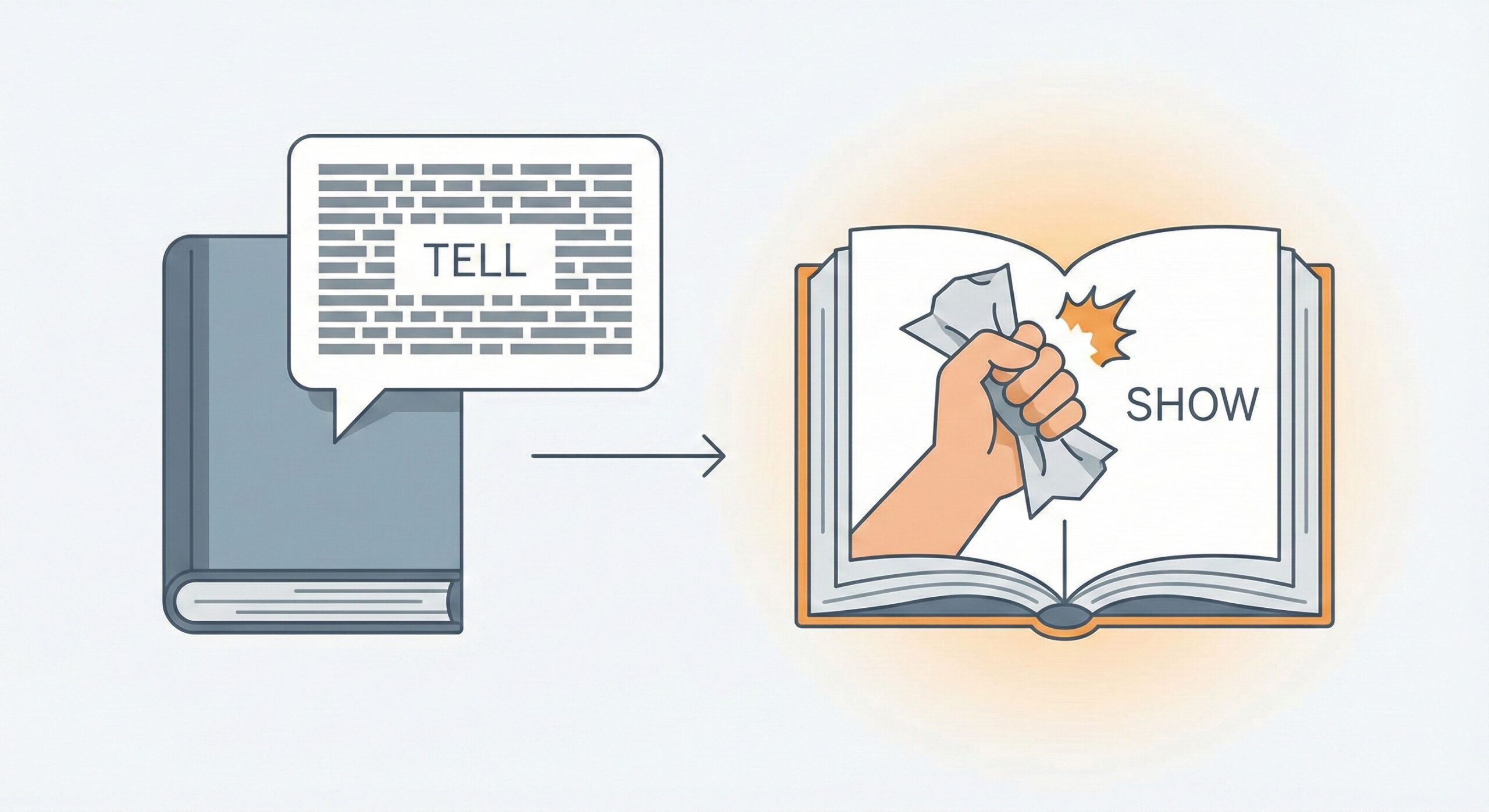“Show, Don’t Tell.”
아마 글 좀 쓴다 하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말입니다.
특히 영미권 시장, 즉 아마존 같은 곳에 도전하는 한국 작가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번역기를 돌리든 전문 번역가를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글을 쓰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설명’하려 듭니다.
작가가 전지전능한 해설자가 되어서 독자에게 정보를 떠먹여 주려고 하죠. 친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독자 입장에선 꽤 지루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설명하기 (Tell)]
“철수는 영희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문장을 읽은 독자의 반응은 뻔합니다. ‘아, 철수가 화났구나.’ 끝입니다. 그냥 정보를 입력받았을 뿐,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기 (Show)]
“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쥐고 있던 종이컵을 홱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여기엔 ‘화가 났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철수가 폭발 직전이라는 걸 압니다. 독자가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만들었으니까요.
한국 소설은 전통적으로 내면의 흐름이나 감정 묘사에 강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같은 문장, 우리에겐 익숙하죠.
하지만 해외 독자들, 특히 장르소설의 팬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작가가 감정을 강요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슬픈 장면이니까 너도 슬퍼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형용사를 빼고 동사를 채우세요.
‘무서웠다’고 쓰지 말고 손을 떨게 하세요.
‘지루했다’고 쓰지 말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만드세요.
물론 모든 문장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빠른 진행을 위해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장면, 독자의 감정을 끌어올려야 하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입을 다물고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독자를 믿으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소설은 훨씬 생생해질 겁니다.